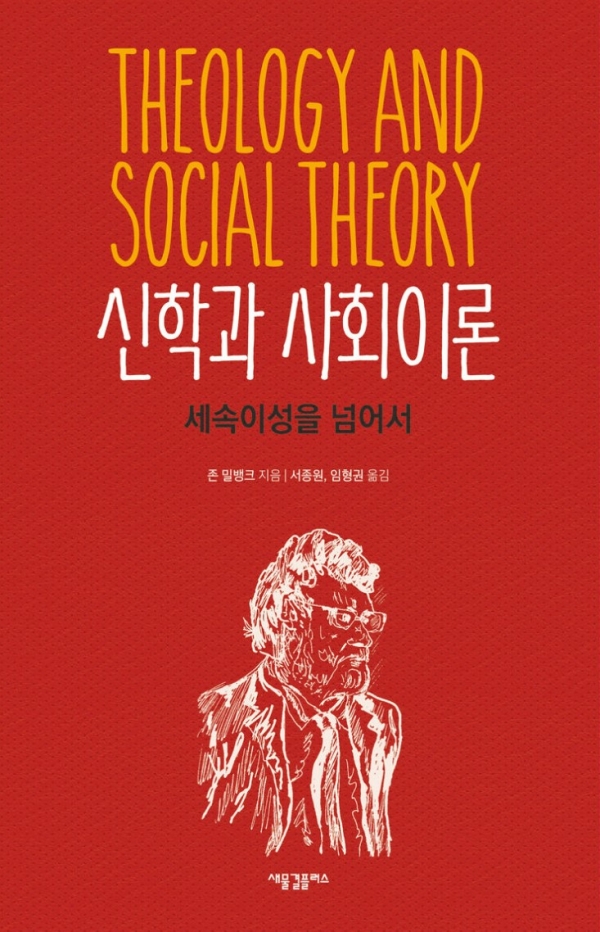
신학과 사회이론
신앙과 이데올로기는 서로를 경계하지만, 교차 될 가능성을 저변에 가지고 있다. 이데올로기가 인정하든 부인하든 간에, 이데올로기도 신앙과 같이 '믿음'을 전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과 이데올로기'를 학문적 언어로 변환하면 '신학과 사회학'으로도 읽을 수 있다. 신학의 기반은 신앙이고, 이데올로기의 전제조건은 사회이다.
이 주제에 대하여 관심있는 이들에게 존 밀뱅크(John Milbank)의 《신학과 사회이론》(Theology and Social Theory)을 소개한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신학과 사회이론의 관계를 고찰한다. 그런데 양자의 관계를 보는 저자의 시각이 대담하다. 근대 이후 신앙이 사사화되었고 기존 교회의 전통적 권위는 과학과 실증주의에 내주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19세기 이후 신학은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자리와는 거리가 영 멀어졌다. 저자는 이에 대해 신학이 "세속 이성에 의해 '자리매김'" 되었다라고 갈파했다.
저자는 오늘날 신학이 사회학과의 관계에서 사회이론들에 의해 '자리매김' 당하는 사태를 두고, 신학이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 이후 신학이 타 학문에 의해 재정의되거나 혹은 타 학문과의 교류 속에서 본연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태들에 대하여 저자는 '비애'라고 표현하면서, 책 저작 의도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힌다: "근대 신학이 처한 비애(pathos)를 극복하고, 아울러 탈근대적(postmodern) 견지에서 신학을 하나의 메타담론(mdetadiscourse)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복원하려는 의도를 띠고 있다."
신학이 하나의 메타담론, 즉 거대담론이었던 시대가 역사적으로 뚜렷하게 있었다. 중세 시대 교회는 '메타담론' 그 이상이었다. 교회의 전통과 권위는 곧 사회의 그것이었고, 사람들의 삶 구석구석을 구성했다. 그러나 밀뱅크가 말하는 '신학의 메타담론으로서의 자리매김'은 중세로 돌아가자는 말이 전혀 아니다. 책에서 신학, 철학, 사회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보이고 있는 저자는 자신의 논지가 "근대 이전에 속한 그리스도교의 입장을 복원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
고대나 중세로의 회귀 없이 신학이 다시 메타담론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이러니하게도 밀뱅크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로부터 찾는다. 니체와 니체주의자들은 후기 근대가 종교에 대해 혐의의 시선을 품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허무주의일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저자의 명확한 주장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니체주의자들은 허무주의가 절대적 '진리'(the Truth)지만 동시에 그 진리의 실천적 표현은 파시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식의 함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중세교회는 개혁의 폭풍을 맞았고 이후 메타담론의 지휘권은 실증주의에 넘어갔다. 특히 니체와 그의 추종자들의 역할은 그리스도교를 향한 부정적 시선까지 덧씌우는데 역할을 했으니, 사회에서 신학이 감당해야 할 절대적 사명은 딱히 없어보였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밀뱅크의 해석과 같이, 이후의 시대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렸다. 허무를 전혀 가지지 않은 실존은 인류역사상 없었겠지만, 근대 이후 현대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허무는 그 이전의 것과는 달리 존재를 당연하게 떠받치고 있던 전통적 필연성이 상실된 허무이다.
그렇다면 니체와 그 후예들의 근대를 거친 현대의 신학은 어떠해야 하는가? 저자 밀뱅크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신학을 제안한다: "자신이 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회 전반에 대한 실질적이고 비판적인 이론의 견지에서 신학적 자기 인식을 정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신학." 이 말의 핵심은 신학이 현대 사람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현대사회를 잘 이해하는 신학이어야 한다는 말인데, 즉 중세 신학의 한계나 근대 신학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저자의 요청으로 받아들여진다. 중세교회는 자기도취에 빠져 사회와 과학의 발전을 애써 눈감고 보지 않으려 했던 실수가 있었다. 근대 신학은 구석으로 밀려나 자존감을 잃어버린 이처럼 오히려 실증적 사회학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저자 밀뱅크는 다소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기는 하지만, 신학과 사회학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립한다: "신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과학일 뿐 아니라...," "모든 신학은 자신을 일종의 '그리스도교 사회학'으로서 재사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의 의도는 신학을 사회학이나 인간학 등으로 환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보다는, '신학과 사회' 혹 '신학과 인간'의 거리를 좁혀, 신학이 인간의 '삶'에서 의미있는 학문이 되게 하고자 시도한 것이 저자의 의도로 보인다. 저자가 책의 후반부에 가서 그리스도교만이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여러 곳에서 역설하는 부분은 그가 그리스도교의 특수성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 밀뱅크의 말마따나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에 기초하여 사고하면 신학은 한쪽 도성을 위한 사회학으로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학이 사회학일 때에도 "그리스도교 신학만이 현재의 허무주의 자체를...극복할 수 있는 담론을 제공한다"는 것이 저자의 견지이다. 근대의 정교한 사회이론들이 인간에게 특정한 비전을 줄 수 있는 것같이 보여도 "사회학은 신학으로부터 적잖은 것을 빌려와서 스스로 유사종교적 지위를 갖는" 학문일 뿐이라는 것이 저자의 견지이다. 또한 자유주의나 사회주의가 더 나은 미래 모형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 근원은 "보편성을 띤 합리적 윤리의 코드가 아니라 단순한 우발성"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적 비전만이 현대의 허무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는 것이 저자의 견지이다.
존 밀뱅크의 《신학과 사회이론》을 신앙과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한다. 이 책은 얼핏 보면 신학을 잠시 아래로 끌어내려 사회학 옆에 동등하게 놓으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얽히고설킨 신학과 사회이론의 실타래를 풀고 신앙을 원래의 자리에 위치시켜놓으려는 의도를 가진 책이다. 이 책이 8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근대 특히 19세기부터 얽혀온 얽힘이 간단치가 않았기에 푸는데 상당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리라. 책을 읽노라면 신학, 철학, 사회학을 아우르는 이 방대한 이야기를 정확한 용어와 어렵지 않은 문장으로 번역해준 번역가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문장을 소개하며 끝을 맺는다:
"근대 신학이 처한 비애는 그 거짓된 겸손에 있다. ... 신학이 메타담론이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할 수 없고, 역사학과 인본주의적 심리학 내지 선험철학과 같은, 유한한 우상들이나 지껄일 법한 수수께끼 같은 목소리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 북리뷰/서평 문의 eleison2023@gmail.com
*책/논문에서 직접 인용한 어구, 문장은 큰따옴표(", ")로 표시하였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