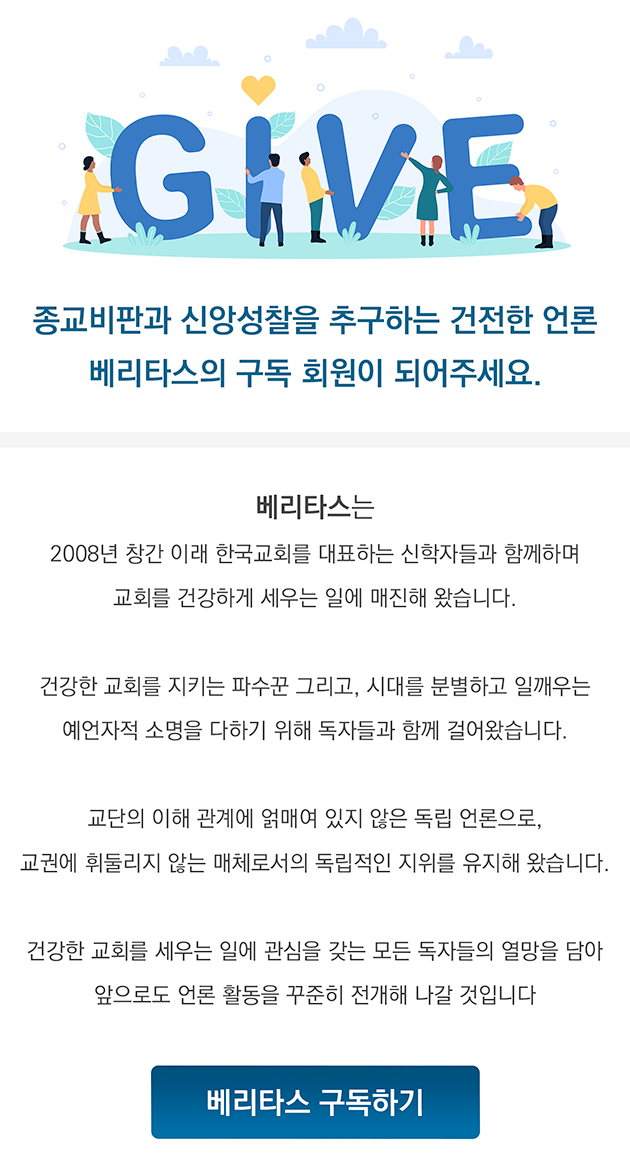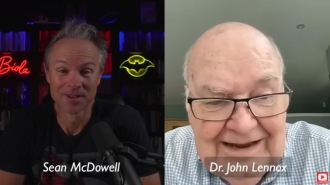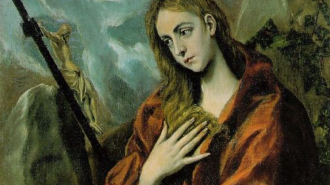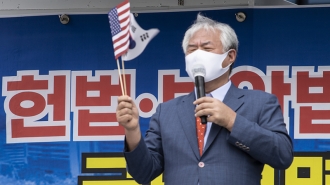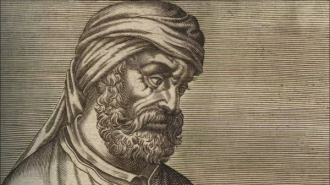출처 : 차정식의 신약성서여행 <바로가기 클릭>
 |
| ▲차정식 한일장신대 교수 |
처녀들의 결혼 문제를 다룬 고린도전서 7:36-38을 건드려볼까 한다. 내 석사논문의 주제인 이 본문은 신약성서에서 가장 난해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주류학설만 3개, 비주류학설도 난무한다. 내 논문의 핵심 논지는 그레코-로마 시대의 '처녀성'이 어떻게 그 금욕적 염결의 가치를 통해 종교적 권위를 강화하여 제의와 예언의 밑천을 삼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직통계시도 처녀가 하면 그 말빨이 더 세다는 식의 논리가 생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태반이었던 것.
2. 간밤에 드문드문 깼는데 쉼 없이 비가 내린 듯하다. 지금도 추적거린다. 비를 갈망하는 것은 지구상 태초의 생명이 바닷물 속에서 발원한 것과 암암리에 연계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러 든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도 그 생태적 기원이 기입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은 것. 라이얼 왓슨의 뛰어난 책 <생명조류>의 후유증이 참 길다. 딴에는 도시문명을 온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기본 일상이 메말라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겹친다.
3. 어린아이들/자식들 사진에 집착하는 욕망은 흔히 순결한 모성, 천진한 동심의 회복으로 포장되어 넘어가는데, 좀더 깊이 파고들면 거기에도 착종된 서푼어치 권력의지가 작동하는 듯하다. '내 몸으로 너를 먹여 키웠어' '너는 내 총체적인 아이콘이야' '너의 순수와 연동되는 한, 이 세상의 부패한 것들과 달리 나는 언제든지 정화된 상태야' 등등이 아닐까.
그러나 그 궤적이 늘 깔끔하게 결론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걸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조건과 연동시켰을 정도로 순수한 신뢰의 열정은 하나님 신앙에서 여전히 상수이다. 그러나 인간의 다층적 욕망의 층위를 그 목회/선교 현장에서 질리도록 체험했을 바울은 '내가 어린아이의일을 버렸노라' '생각하는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충고한다.
4. 대학의 교양강좌를 듣고도, 심지어 20세기 후반에 신학대학의 물을 먹고 나서도 천국/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내세 천당과 연계시키고 잔망스런 묵시의 분위기를 풍기며 영발을 세우는 치들을 나는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어제 구역예배의 자리에서 문 집사님은 대학시절 SFC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적인 계몽과 함께 신앙적 개안을 한 뒤로 얼마나 어떻게 세계관이 달라졌는지 고백했다. 가만히 듣자하니 그것은 결국 책읽기의 경험을 제 몸에 새기며 깨닫는 근대의 체험에 다름 아니었다. 결국 신앙의 진보에서도 공부가 중요한 것이다. 공부의 밀도와 심도가 그 언어와 사고와 삶의 창발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고대와 중세에 왜 아름답고 숭고한 가치가 없었으랴! 그러나 그들의 언어와 가치를 치밀하고 풍성하게 재해석함 없이 생짜배기로 토해내는 그 도저한 인습이 나는 역겹다.
5. 일상의 자잘한 억압과 분노의 축적, 치명적인 상처의 경험이 끼치는 정신병리학적 후유증에 대해 다시 성찰해본다. 그것은 얼마나 집요한 자기 망집과 대리배설적 환상의 출처인가. 나는 내가 본 환상과 들은 환청, 내가 꾼 꿈의 묵시적 징조들에 대해 그 서늘한 초월성의 여백을 침묵으로 두둔하면서도 내 자신의 무의식에 깃든 욕망의 핵자를 건드리는 정신분석적 태도로 접근했다. 내 영성의 그늘에는 여전히 은근한 포즈로 정신병리학이 자리해 있다.
6. <슬픈 예수> 대신 사정상 <슬픈 붓다>를 먼저 사서 읽게 되었다. 결국 역사적 붓다를 추적한다는 얘기인데, 동어반복이 심하고 변죽이 잦다. 대신 그것을 무마하려는 수사적 변통은 약해 보인다. 자료가 거의 없고 희박하다면, 그 사실을 얘기하고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다만 오늘날 대부분의 붓다상은 전설적인 발상으로 옛사람들이 꾸며낸 것이라고 말하면 족한데, 뭐 그리 잡다한 변설의 잔가지가 많은지. 내 책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을 텐데, 내가 말과 글로 뿌린 죄악의 짐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