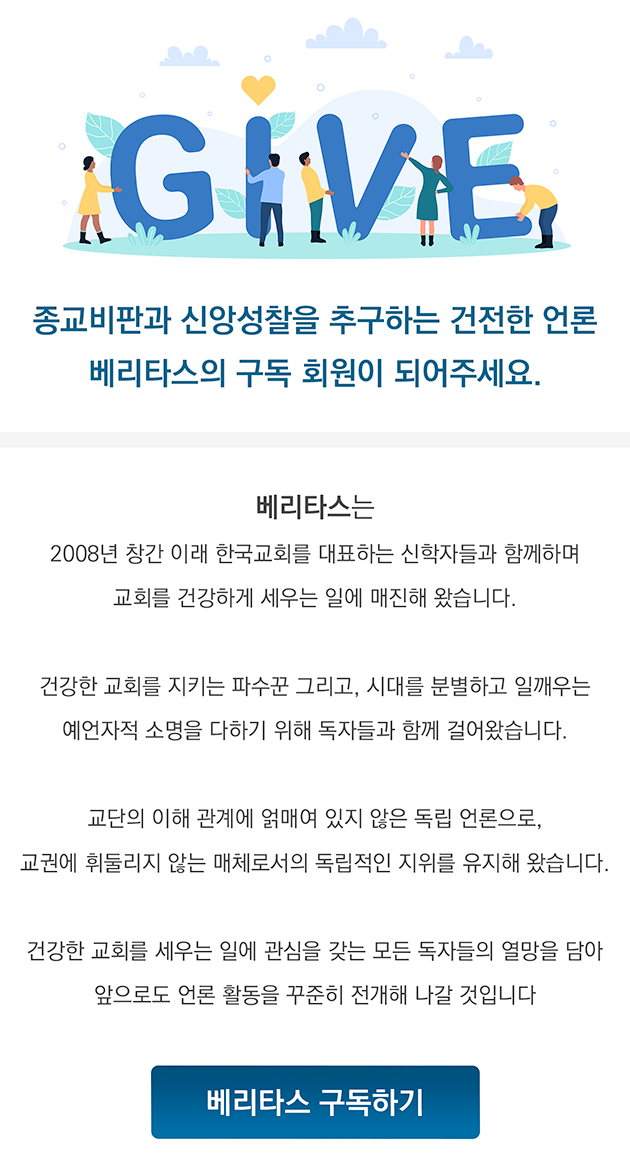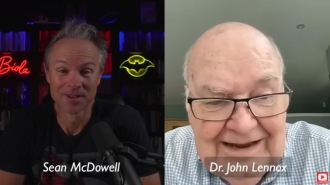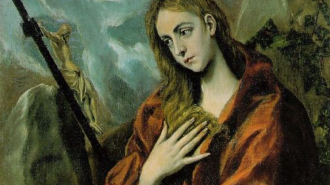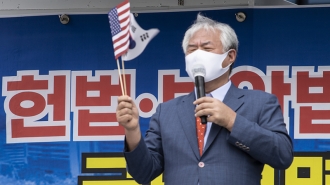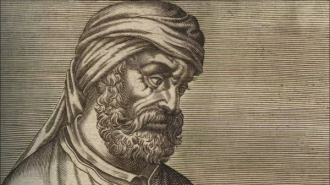제목 : 21세기 Q 연구의 새로운 방향
발표 : 소기천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신학 교수/예수말씀연구소 소장)(2009년 12월 11일 한국신약학회 제 4회 콜로키움에서 발표)
1. 서론
한국 신약학회에 역사적 예수, 복음서 문제, Q, 나그 함마디 문서, 예수말씀 전승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수가 많다. 그만큼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국에 많은데, 이 자리에 이렇게 5명만이 발제자로 나서게 된 것이 여간 송구스러운 일이 아니다. 발제를 마친 후에 여러 전문가들이 활발한 지적과 토론을 통하여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를 바란다. 이번에 Q 콜로키움을 통해서 이런 주제를 깊이 전공한 많은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관복음서 전승과 Q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란 발표와 패널 토론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오늘 단 하루의 일회적인 모임으로 그치지 말고 향후 계속적으로 분과모임으로 자리를 잡아 한국교회와 세계의 신학계를 섬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필자는 신약성서 경전 형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도성’의 개념과 더불어 ‘유대성’의 개념을 한국신약학회가 헬라어 신약성서(Novum Testamentum Greece)에 대해 새롭게 가져야 할 의미와 연관을 지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자료인 Q를 토대로 하여 Q 본문은 학자들의 학문적인 노력으로 복원된 가설적인 문서로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Q를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된 사본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헬라어 신약성서도 수천 개의 사본들을 기초로 복원된 것이다. 양자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Q의 복원은 사본이 두 개이기 때문에 지극히 단순한 반면에 헬라어 신약성서는 사본이 수천 개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다. 양자 사이의 공통점이 있다면, 복원된 Q와 헬라어 신약성서는 둘 다 아직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정되어야 하는 운명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한국교회가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지고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신약학회의 주도하에 새로운 방법론인 내러티브 본문비평과 상호본문성에 입각하여 ‘선택과 결정’이라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향후 21세기 헬라어 신약성서의 새로운 판본을 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본으로 한 새로운 우리말 신약성서의 번역본을 출판해야할 필요성까지 제기하고자 한다.
Q 연구를 내러티브 비평에만 국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Q 본문이 학자들의 학문적 노력에 의해 복원된 문서이므로, 여전히 본문비평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필자는 Q 연구를 통해 복원된 Q 본문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Q 본문을 문맥의 연속성 속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내러티브 본문비평과 상호본문성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2. 사도성과 유대성
신약성서가 경전으로 채택되기 위하여 27권의 목록이 최종적으로 등장한 것은 367년의 일인데,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는 신약성서 27권의 목록에 대하여 ‘구원의 근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경전으로 포함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성서가 구원의 근원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최종 평가를 받기까지 사실상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있어서 27권의 책들은 다양한 정경 선택의 기준들에 입각하여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곧 다양한 정경 선택의 기준들이란 수 세기에 걸쳐서 신앙 공동체에 의해 사용된 증거가 뚜렷하고, 초기 교부들에 의해 다양하게 이용되고, 사도들에 의해 써지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된 신조인 초기 그리스도인의 신앙 규범(regula fidei)에 의해 인정을 받는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말한다. 이렇게 정경 선택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우리는 초기교회에서 어느 한 순간에 일시적으로 정경의 형성과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음의 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경 형성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처음 300년 동안의 삶과 동일한 시간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교회회의나 감독회의에서 규범적인 책들을 결정하여 그 후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최종적으로 정경에 포함된 책들은 수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예배와 가르침에서 그 책들을 사용했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일으키고 풍성하게 하고 바로잡는 데서 그 책들이 드러내었던 능력을 존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경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형성되는 수 세기 동안 그 공동체의 전체적인 경험과 이해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초기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가 신약성서를 줄기차게 사용함으로써 4세기에 이르러서 자연스럽게 경전이 채택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적 가르침 곧 ‘사도성’이다. 왜냐하면 신약성서가 ‘사도적 저작성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정경을 결정한 것’은 아주 주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비록 사도적 저작성이 정경 형성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었고 어떤 신약성서의 책들에서 사도적 기원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초기교회의 정경 형성에 있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주는 영향력은 참으로 지대하였다.
이러한 사도성의 중요성 때문에 신약성서의 책들은 사도들의 이름으로 붙여지게 된 것이다. 곧 당시에 신약성서의 정경 목록에서 제외된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지혜서, 헤르마스의 목자, 시락서,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클레멘트 서신 등도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많이 읽힌 책들이지만 사도성의 원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에 신약성서의 정경 형성 단계에서 경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사도성을 충족시키는 책들 중에서 베드로 복음서, 빌립 복음서, 사도바울의 기도, 야고보의 묵시록, 베드로 묵시록, 베드로 행전, 빌립에게 보낸 베드로의 편지, 마리아 복음서, 요한의 비사 등은 왜 신약성서의 정경 목록에 오르지 못한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1945년에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 발견된 나그 함마디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나그 함마디 문서는 20세기 고고학적 발굴에 있어서 사해 문서와 더불어서 성서고고학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 비록 나그 함마디 문서가 ‘역사적 예수연구의 판도라 상자’로 불릴 만큼 오늘날도 여전히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서 자체는 헬라어가 아닌 콥트어로 기록이 되었으며 185년경에 오리게누스와 테르툴리아누스와 이레내우스와 같은 교부들에 의해 영지주의 이단문서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비록 사도들의 이름이 붙여진 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성서의 경전에 들지 못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성서의 정경 기준이었던 사도성 이외에 또 하나의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기교회가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규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유대성’이라는 요소이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신약성서를 경전으로 간직하기 이전에 구약성서를 정경으로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에 반기를 든 사람은 2세기에 에데사의 마르시온이었다. 그는 구약성서를 열등하다고 생각하여 완전히 배격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영적인 지식만을 최고로 간주하는 영지주의 이단을 대표하는 견해였기에, 초기 그리스도교는 구약성서와 초기 유대교적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성에 입각하여 영지주의를 초기교회의 이단으로 강력하게 규정하여 제거하였다.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의 무대 전면에서 사라진 영지주의 이단은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나그 함마디 문서를 통하여 전해진 것과 같은 문서들을 만들어 냈지만, 어느 것 하나도 구약성서와 초기 유대교의 전통 위에 서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성서의 정경 형성 단계에서 경전에 들지 못하였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정경을 결정하는데 유대성이 지니는 중요성은 다음의 글에 충분히 나타나 있다.
사실상 역사적으로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이 1세기에 일어났을 때,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일종의 ‘성서를 위한 전쟁’과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교회가 고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존재하면서,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교 메시지와는 반대되는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의 경전과 같은 본문을 읽었던 상황에서 교회는 정체성을 세워야 했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스라엘의 경전을 해석할 때 그 초점은 고대 이스라엘과의 연속성에 접근하는 길을 찾았는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목적들과의 연속성에 접근하는 길을 찾는데 맞추어졌다.
비록 이러한 설명에 ‘유대성’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구약성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서문이고 신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점에서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스라엘의 경전을 구약성서의 가르침에 입각한 유대성의 기준으로서 신약성서의 경전화 과정에서 정경의 근거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신약성서에서 텍스트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유대인이었다. 예수께서는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기도하고 설교하셨다. 부활절 이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예수를 본받아서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기도하였다. 왜냐하면 그들도 유대인들인지라 회당에서 소속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유대적 전통에 충실하셨고 어떤 점에서는 종교적일 정도로 열심이셨다. 이 점에서 초기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를 놓으신 예수의 유대적 특성은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적 신앙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을 분열시킨 요소가 율법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일치로 인해 기인된 것이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유대성을 예수의 유대적 가르침에서 재발견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역사적 모습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분명한 연관성(continuum) 속에 있지만, 그것은 연속성과 동시에 불연속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곧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하나는 모세 시대에, 다른 하나는 예수 시대에” 각각의 기초를 놓게 됨으로써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서로 “유대교가 ‘어머니’ 종교이며, 기독교가 ‘딸’의 종교”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비록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가운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시작된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남긴 지혜문학 장르인 Q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4복음서가 예수를 선포된 자로 묘사하는 것과는 달리 Q에서는 예수께서 항상 선포하는 자로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Q는 4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유대적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였다. 이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에 대한 전형적인 유대적 표현방식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적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곧 새로운 메시아로 이해하는 흐름은 Q로부터 시작하여 마태복음을 거쳐서 이레내우스에 이르기까지 초기 그리스도교의 정통성을 유대성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바로 이러한 초기 그리스도교의 유대성은 역사적 예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결과를 놓고 볼 때, 유대적 정통성은 2세기에 플라톤의 이원론적 철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영지주의 교단을 이단으로 거부하면서 나그 함마디 문서에 있던 모든 콥트 문서들을 경전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정통교회의 결단은 유대성에 근거한 것이므로, 당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신약성서 경전화 작업에 있어서 유대적 전통은 사도성 못지않게 텍스투스 리켑투스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였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이단과 정통 논쟁에 있어서 유대성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나그 함마디 문서가 이단 문서로 거부되고 신약성서 27권이 경전으로 채택되는 상황에서 과연 사도성과 유대성의 개념은 텍스투스 레켑투스로 간주되었는가? 신약성서에서 kanw,n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우리말 성서에서 정경이라는 의미보다는 범위나 규범, 혹은 규례로 번역되어 있다.
고후 10:13 h`mei/j de. ouvk eivj ta. a;metra kauchso,meqa avlla. kata. to. me,tron tou/ kano,noj ou- evme,risen h`mi/n o` qeo.j me,trou( evfike,sqai a;cri kai. u`mw/nÅ
고후 10:15 ouvk eivj ta. a;metra kaucw,menoi evn avllotri,oij ko,poij( evlpi,da de. e;contej auvxanome,nhj th/j pi,stewj u`mw/n evn u`mi/n megalunqh/nai kata. to.n kano,na h`mw/n eivj perissei,an
고후 10:16 eivj ta. u`pere,keina u`mw/n euvaggeli,sasqai( ouvk evn avllotri,w| kano,ni eivj ta. e[toima kauch,sasqaiÅ
갈 6:16 kai. o[soi tw/| kano,ni tou,tw| stoich,sousin( eivrh,nh evpV auvtou.j kai. e;leoj kai. evpi. to.n VIsrah.l tou/ qeou/Å
원래 kanw,n은 어떤 것을 측정하는 수단을 가리키는데, 이를 테면 수치를 결정하는 줄자나 표준을 뜻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kanw,n이 갈라디아 6장 16절(참고, 클레멘트 1서 7:2)에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고린도후서 10장 13, 15-16절에서는 어떤 행동을 위한 방향이나 형식을 뜻하는 것으로 심화되고 있다(참고, 클레멘트 1서 1:3). 이러한 의미가 2세기의 초기 그리스도교에 의해 진리를 나타내는 표준으로 사용되어 ‘신앙의 규범(rule of faith)이란 뜻을 가지게 되면서, kanw,n은 경전의 목록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특히 갈라디아 6장은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복음의 중요성을 말하는데(갈 6:11-14), 거기서 바울은 율법적인 할례와의 관계에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갈 6:15)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갈 6:16)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일련의 구절 속에서 우리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부여받게 된 사도적 위치 곧 그의 사도성과 동시에 율법을 재해석하면서도 여전히 구약성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유대적 위치 곧 그의 유대성을 확인하게 된다.
고린도후서 10장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어 13장까지 이어진다. 이 문단에서 바울은 소위 자신의 적대자들을 경계하고 있는데, 곧 그는 거짓 사도들을 풍자하면서(10:12; 11:21; 12:13) 원래 그들은 고린도교회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10:12-16; 11:4). 이러한 바울의 논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의 사도성에 관한 변증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13장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는 12장에서 셋째 하늘과 낙원에 관한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 때 절정에 도달한다(12:1-7). 셋째 하늘에 관하여는 당시 유대문헌에서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식을 바울이 따랐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낙원에 관해서도 70인 역(LXX)에서 에덴동산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할 때 아주 의미있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루 퍼져있던 구약성서의 전통위에 서있는 유대성에 입각하여 적대자들을 대응해 나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성과 유대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바울이 적대자들과 논쟁을 벌일 때 등장한 아주 구체적인 단어 하나가 바로 kanw,n이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가 2세기에 신약성서 정경 목록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 점을 중시할 때, 우리는 초기 교회에서 사도성과 유대성의 원리가 다름 아닌 신약성서를 경전으로 채택하게 하는 텍스투스 레켑투스의 원리 곧 kanw,n의 원리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록 신약성서에 텍스투스 레켑투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신약성서를 경전으로 채택하게 한 원리인 사도성과 유대성의 원리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신약성서의 원문을 확정하는 kanw,n의 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내러티브 본문비평과 상호본문성
내러티브 본문비평이란 무엇인가? 신약성서를 이야기의 흐름과 구조와 구성요건을 중시하여 연구하는 것이 내러티브 비평이고, 신약성서의 본문을 내러티브의 틀 속에서 이해하여 본문에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내러티브 비평과 본문비평의 상호관계 속에서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내러티브 본문비평이다.
엘든 엡(Eldon Jay Epp)은 평생 동안 본문비평 연구에만 매달린 학자로서 2000년 4월에 사우스웨스턴 침례교신학교에서 모인 세계본문비평 학회에서 대표 연설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연설을 통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선택과 결정’이라는 다섯 가지의 원리들을 제안하였다.
이문 중에서 선택하기보다 우선권을 결정하기.
사본 중에서 선택하기보다 그룹을 결정하기.
비평본 중에서 선택하기보다 타협점을 결정하기.
콘텍스트를 선택하기보다 영향력을 결정하기.
목적과 방향을 선택하기보다 의미와 접근방법을 결정하기
엘든 엡은 이상의 다섯 가지 원리가 단순히 본문비평을 기술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과 학문’의 차원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마지막에 언급된 ‘목적과 방향을 선택하기보다 의미와 접근방법을 결정하는 원리’는 헬라어 신약성서의 ‘원본’(the original text)을 찾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사실상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교회는 저마다 원본 신약성서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본문비평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원본 신약성서를 찾아가는 의미와 접근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엘든 엡은 본문비평적인 작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내러티브 비평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으로 엘든 엡의 설명을 통하여 우리는 그동안 헬라어 신약성서의 원본을 찾는 작업을 수행해 오면서 학자들이 한가지로 중시하였던 본문비평적인 작업에 더하여 내러티브 비평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공감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방법론을 ‘내러티브 본문비평’이라고 부르고자하며,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에 도움을 받아서 21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헬라어 신약성서를 준비할 수 있다. 사실 이 용어는 파커(David C. Parker)가 JTS 45 (1994): 704에서 어만(Bart Ehrman)이 1993년에 출판한 책인 The Orthodox Corruption of Scripture란 책을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후에 파커는 이 용어를 그의 후속작인 The Living Text of the Gospe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특히 주기도(49-74)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75-94)을 연구하면서 이 용어를 다시 사용하였다. 내러티브 본문비평은 헬라어 신약성서의 원본을 찾는 작업에서 텍스투스 레켑투스의 새로운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21세기에 새로운 헬라어 신약성서인 Novum Testamentum Greece의 새로운 판본을 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본으로 한 새로운 우리말 번역 신약성서가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에 맞게 한국신약학회에서 연구되기를 희망하면서, 필자는 내러티브 본문비평에 덧붙여서 상호본문성의 원리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학자들은 신약성서의 본문에서 구약성서의 본문을 연구하는 방법을 일찌감치 터득하여 적용해 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상호본문성이라고 부른다. 구약성서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였던 신약성서의 기자들의 방법을 가리켜서 정경비평 학자들(예를 들면, Bernard S. Childs와 James A. Sanders)은 상호본문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신약성서의 본문을 확정하는데 구약성서를 참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마가복음 2장 26절에 언급되고 있는 제사장은 ‘아비아달’이지만, 사실 구약성서에는 ‘아히멜렉’으로 되어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원본을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급할 수 있는 상호본문성의 방법들로는 (1) 직접 혹은 간접 인용구 - 구약이 신약에 인용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방법, (2) 암시 - 구약이 신약에 암시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방법, (3) 반향 - 구약이 신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방법, (4) 석의 -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방법, (5) 짜깁기 - 신약이 구약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방법, (6) 유사구조 - 신약 이야기가 구약과 유사한 것에 관심을 갖는 방법 등을 가지고 마가복음 2장 26절에 나타나 있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상호 연관성을 연구할 수 있다.
내러티브 본문비평과 상호본문성은 주어진 본문을 생산하고 수용함에 있어서 성서기자들이 다른 본문의 지식에 의존하는 모든 방식들을 포괄하기 위한 방법론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언급한 내러티브 본문비평과 지금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방법인 상호본문성의 도움을 받아서 마가복음 2장 23-28절의 안식일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 예수께서 언급한 인물은 아히멜렉이라는 사실에 도달할 수 있다. 비록 모든 헬라어 사본들이 예외 없이 아비아달을 언급하고 있을지라도, 본문에 대한 내러티브 읽기가 구약성서 본문과의 상호본문성에 입각하여 이해한다면 아히멜렉으로 판명이 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예를 언급하자면, 마태복음 27장 9-10절도 모든 헬라어 사본들이 예외 없이 예레미야로 언급되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원본을 확정하는데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본문에 대한 내러티브 읽기를 구약성서 본문과의 상호본문성에 입각하여 이해한다면 인용된 구절의 예언자 이름은 스가랴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9-10절에서 인용되고 있는 구절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스가랴 11장 12-13절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단지 마태복음에서 예레미야라는 이름만 이 이야기에 연관이 되어 있을 뿐이다. 곧 예레미야 18장 1-3절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와 예레미야 32장 6-10절에 나오는 밭을 사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 9-10절에 암시적으로 언급될 뿐이므로, 직접적으로 마태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스가랴 11장 12-13절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Q의 예를 언급하자면, Q 14장 5절의 경우에 ‘소’로 복원된 단어가 마태복음 12장 11절과 누가복음 13장 15절과 14장 5절의 평행구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복음서 이전 전승 자료인 구약성서에 나타나 구절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구약성서에서 출애굽기 21장 33-34절, 22장 4절, 23장 5절, 신명기 5장 14절, 22장 4절(참고 사 32:20) 등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소’이기에 Q 14장 5절의 복원은 구약성서와의 상호본문성에 입각하여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제단에 제물로 드린 대표적인 것이 ‘소’이기에 내러티브의 구성상 Q 14장 5절을 ‘소’로 복원하는 것은 아주 개연성이 많은 선택이다.
카슨(D.A. Carson)은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오류를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가 언급하고자하는 것은 신약성서 기자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성서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참으로 오랜 시간동안 사건과 해석과 전승과 기록과 보전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헬라어 신약성서의 원본을 찾는 텍스투스 레켑투스의 작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과거와는 다른 방법인 내러티브 본문비평과 상호본문성의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텍스투스 레켑투스의 방법은 현존하는 사본들을 가지고 원본을 찾아나서는 방향 위에 서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신약성서 원본을 아직 완전하게 복원하지 못하였다. 사본의 오류뿐만 아니라 성서기자의 오류 가능성도 바로잡고 완전한 신약성서 원문을 복원하기 위해 우리는 내러티브 본문비평과 상호본문성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에 의거하여 우리는 헬라어 신약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실체를 확립하여야 한다.
4. 결론
흔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것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은 모두 성서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대한 행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본과 역본을 비교 대조하면서 헬라어 신약성서의 원본을 복원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전도서 기자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전 12:12)고 말하였다. 이것은 전도서 기자가 인간이 행하는 수고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한 말이다. 헬라어 신약성서의 원본이 발견되지 않는 한, 우리가 새로운 방법론을 가지고 21세기에 사용될 신약성서를 복원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도 결코 끝이 없을 것이다.
필자는 4세기에 이르러서 신약성서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되도록 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오늘날의 텍스투스 레켑투스에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사도성과 유대성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연구하였다. 또한 필자는 21세기에 새로운 헬라어 신약성서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안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론인 내러티브 본문비평을 도입하여 상호본문성의 원리를 통해 신약성서 원본을 확립하는 길을 모색할 것을 연구하였다.
끝으로 지난 20년 동안에 한국인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온 Q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면서, 향후 우리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세계성서학회가 후원하는 Q 연구 분과에 나가서 한국 학자들이 활발하게 공헌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한다.
5. 한국인의 Q 연구 목록
1) 저서
강성도 유태엽, 잃어버린 복음서 Q(클레어먼트: 아시아 태평양 목회연구원, 1995).
김명수, 원시그리스도교 예수 연구.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 1999.
______, 역사적 예수의 생애.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4.
______, 큐 복음서의 민중신학. 서울: 통나무, 2009.
김용옥, 큐 복음서: 신약성서 속의 예수의 참 모습, 참 말씀, 서울: 통나무, 2008.
김재현, Q의 예수 이야기: 최초의 내러티브 신학을 찾아서- Q에 내재된 예수에 관한 짧은 이야기.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9.
김찬희 교수 회갑기념 학술논문집 간행위원회, 성서와 이민신학(클레어먼트: 아시아 태평양 목회연구원, 1995).
나요섭, 예수에 관한 첫 글 Q. 대구: 나의 주, 2002.
노태성,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자기 이해 上: 말씀어록과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서울: 크리스챤 헤럴드, 2005.
소기천, 예수말씀의 전승궤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______, 예수말씀 복음서 Q 연구개론: 잃어버린 지혜문학 장르의 전승자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신현우, 역사적 예수연구의 규칙: 참된 예수를 찾아서. 서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2005.
조태연, 예수운동: 그리스도교 기원의 탐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2) 박사 학위논문
박인희, “Q의 민중 서사적 성격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학과, 2009.
김재현, “Q의 예수 이야기: Q에 대한 서사비평적 연구,” 학위논문(박사)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2008.
권의구, “인자 기독론 연구,” 학위논문(박사) 한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2000.
3) 석사 학위논문
한명복, “바알세불 논쟁과 마태공동체 연구 : 마태복음 12장 22-30절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2007.
윤효심, “누가복음 16장 1-18절에 대한 신명기와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2004.
나현수,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서의 예수말씀(Q)의 반영: 예수말씀 복음서(Q)의 전승궤도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2004.
윤석안, “ 예수말씀(Q) 14:26-27; 17:33; 14:34-35의 연구: Q공동체와 제자됨 이해,” 학위논문(석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2004.
김재현, “Q의 세례자 전승에 관한 역사 비평적 연구,” 학위논문(석사)- 경성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2003.
손명수,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난 예수와 바리새인의 갈등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2003.
박운장, “Q 공동체의 이방인 선교에 관한 고찰,” 학위논문(석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2003.
이세훈, “Q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체성: 선교 파송 본문(Q 10:2-16)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2003.
김중권, “한국 선교초기 기독교 와 Q공동체에 나타나는 예수운동 비교 연구,” 학위논문(석사)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2002.
노규석, “예수 말씀 전승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미친 영향: Q 12:28-31절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변재홍, “예수의 공생활 중에서의 제자파견 기사에 관한 연구: 루가 10,1-16을 통한 Q 전승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2000.
김철현, “예수연구,” 학위논문(석사) 대전: 목원대학교, 1998.
김상혁, “Q 문서의 편집층에 따른 Q 공동체의 사회사 연구,” 학위논문(석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7.
천세광, “공관 복음서 안의 묵시 문학적 전승에 대한 연구: 마가복음과 Q 출처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1996.
최원준, “Q의 지혜 기독론 연구,” 학위논문(석사)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신학과, 1995.
고동훈, “Q 에 나타난 지혜 기독론,” 학위논문(석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1994.
황현석, “유대 묵시사상과 Q 전승에 나타난 예수 운동의 비교연구,” 학위논문(석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약신학전공 1993.
김문조, “Q문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학위논문(석사) 목원대학 신학대학원: 신학과, 1987.
4) 외국 학위논문
Myung-Soo Kim, “Die Trägergruppe Von Q: Sozialgeschichtliche Forschung Zur Q-Überlieferung in den Synoptischen Evangelien,” (Verlag an der Lottbek, 1990).
Tae Yeon Cho, “The Son of Man Came Eating and Drinking (Matt 11:19): A Study of the Table Fellowship in Qumran and Q,” Thesis(PH. D.) Drew University, 1992.
Bak Woon-Chul, “La Christologie de la Source Q,” Thesis(Ph. D.) Institut Catholique de Paris, 1997.
Ky-Chun So, “The Sabbath Controversy of Jesus: Between Jewish Law and the Gentile Mission,” Thesis(Ph. D.) Claremont Graduate Univesity, 1998.
______, “A Comparative Study of the Psalms of Solomon and the Sayings Gospel Q in the Christological Insights.” Thesis(M. A. T. S.)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994.
Hyung-Dong Kim, “A Study of Q: the Kingdom of God and Its Rejection as a Hermeneutical Key in Q,” Thesis(PH. D.) Drew University, 1998.
Kyu Sam Han, Jerusalem and the Early Jesus Movement: The Q Community's Attitude Toward the Templ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207 (London; New York: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5) 연구논문
김덕기, “Q의 비유장르와 역사적 예수 탐구,” 신약논단 제9집(2002): 255-290.
김명수, “Q와 동양적 지혜의 예수: 초기 그리스도교 Q 공동체의 예수 휴머니즘,” 神學思想 제142집(2008): 63~94.
______, “원시 그리스도교 Q 공동체와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의 관계,” 神學思想 제137집 (2007): 67~9.
______, “어록 공동체의 카이로스 실천,” 말씀과 교회 통권21호(1999): 61~71.
______, “예수의 대안공동체,” 神學思想 제106집(1999).
______, “어록(Q) 공동체의 민중 케리그마,” 基督敎思想 통권437(1995).
______, “예수어록의 종말론,” 종교신학연구 5집(1992).
______, “어록공동체의 원수사랑 계명과 폭력이해,” 神學思想 제75집(1991).
______, “원시 그리스도교 Q공동체의 주변부 민중 예수,” 神學思想 제71집(1990).
______, “원시그리스도교 Q공동체의 주변부 민중 예수,” 神學思想 제68집(1990).
김형동, “마가는 Q를 몰랐는가?,” 신약논단 제15권 제2호(2008): 341~376.
______, “축복선언과 화선에 나타난 신학적 특징과 예수 첫 공동체의 삶의 정황- 눅 6:20-23, 24-26,” 성경연구 10권3호/통권111(2004): 31~38.
______, “이단적 담론 Q,” 神學思想 제127집(2004): 199~227.
______,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 Q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상징성과 선교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할,” 신약논단 제9권 제2호(2002): 295~318.
______, “<예수 말씀의 전승 궤도> 소기천 지음 / 서평,” 신약논단 제9권 제1호(2002): 251~254.
______,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 침노에 관한 두 본문 (눅 16:16 / 마 11:12): Q 16:16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이해,” 성경원문연구 제8호(2001): 207~215.
______, “Q 공동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예언자의 관점의 중요성: 예수전승과 공관복음의 교회론,” 신약논단 제7권(2001): 104~121.
______, “예수의 초기 말씀자료(Q)에 나타난 묵시(문학)적 종말론과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 서울長神論壇 제8집(2000): 203~224.
______, “Q연구: Q의 해석학적 열쇠로서의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거부: 역사적 예수와 예수 전승,” 신약논단 제6권(2000): 59~92.
______, “Q와 하나님의 나라: Q의 시작과 끝에 대한 연구,” 김형동 神學思想 제105집 (1999).
______, “Q 축복선언(Q 6:20~34)과 Q 화선언(Q/눅 6:24~26; Q 11)에 나타난 Q 형성의 신학적 특징,” 김형동 서울長神論壇 제7집(1999): 86~108.
나요섭,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Q공동체의 자리 찾기: 예수전승과 공관복음의 교회론,” 신약논단 제7권 제2000호(2005): 85~103.
______, “예수 첫 글 Q의 저작시기에 대한 연구,” 신약논단 제11권 제3호(2004): 577~596.
______, “바울의 Q 사용에 대한 연구,” 신약논단 제11권 제1호(2004): 3~34.
______, “Q의 편집단계와 신학의 발전,” 신학과 목회 제14집(2000): 89~114.
박인희, “Q의 서사적 특성과 공동체,” 신약논단 제16권 제3호(2009): 745-788.
백운철, “예수어록의 아들 그리스도론,” 사목연구 제5집(1997): 137-163.
______, “장터 어린이들의 비유: 루가 7,31~35; 마태 11,16~19,” 사목연구 제6집(1998): 153~181.
______, “예수와 오시는 분,” 사목연구 제9집(2001): 109-131.
소기천, “Jesus' Understanding of Spirit," Korean Journal of Theology 2 (2000): 52-69.
______, “The Eschatology of the Q Community,” Korean New Testament Studies: Journal of the New Testament Society of Korea. Vol. 9 No. 3 (Autumn 2002): 619-636.
______, “Dating Q Regarding to the Community Rules in Jesus' Inaugural Sermon.” Korean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Vol. 3 (May 2003): 32-65.
______, "Jewish Mission and Gentile Mission in the New Testament." Mission and Theology 12 (2003/12): 350-365.
______, "The God of Jesus, the Q Community, and the Gospel of Luke." Korean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Vol. 5 (May 2005): 9-27.
______, "The Sabbath and the Synoptic Problem." Theological Forum. Vol. 43 (2006. 2): 767-782.
______, “예수말씀 복음서 Q.” 성경원문연구 5(1999년 8월): 140-167.
______, “Q 10:21-24; 11:2-4, 9-13에 나타난 기도-The Critical Text of Q Unformatted.와 The Critical Edition of Q의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4(2004년 4월). 대한성서공회: 58-86.
______, “Q 6:37-45의 위치, 배경, 전승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 성서. 여성. 신학-장상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184-212.
______, “주기도문의 번역과 Q 공동체의 종말론에 관한 연구” Canon & Culture 제2권 1호(통원 3호. 2008년 봄): 209-244.
______, “지난 2000년의 Q 연구와 21세기의 새로운 방향- 박인희 박사의 연구를 중심으로.” 2009년 제38차 한국기독교학회 공동학회 한국신약학회 자유논문 발표집(2009년 10월 16-17일. 침례교신학대학교 자유관): 79-86.
성종현, “예수어록(Q-자료)연구 동향,” 敎會와 神學 제24집(1992).
오우성. “예수의 잔치 비유에 대한 역사비평적 연구,” 신약논단 제 6권 (2000): 9-34.
조태연, “나의 식탁 속에 내가 있다- Q 문서의 식탁교제에 관한연구,” 현대와 신학 제17집(1993): 157~178.
최재덕, “마태복음 24:45-51; 누가복음 12:42-46에 나타난 섬기는 예수 공동체,” 신약논단 제 6권 (2000): 35-58.
______, “공관복음에 나타는 예수 로기아의 진정성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신약논단 제3권(1997): 107-124.
6) 번역서
게르트 타이쎈; 아네테 메르츠 저, 역사적 예수: 예수의 역사적 삶에 대한 총체적 연구, 손성현 옮김(서울: 다산글방, 2001).
루돌프 불트만, 공관복음서전승사, 허혁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
불트만[등저], 복음주의 신학총서 14: 현대 역사적 예수 논구, 전경연 편; 박봉랑 편(서울: 향린사, 1964).
루크 티모시 존슨 지음, 누가 예수를 부인하는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잘못된 탐구와 복음서 전승의 진리, 손혜숙 옮김(서울: CLC, 2003).
마커스 보그; N. 톰 라이트 공저, 예수의 의미: 역사적 예수에 대한 두 신학자의 논쟁, 김준우 옮김(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1).
버튼 L. 맥, 잃어버린 복음서: Q 복음과 기독교의 기원, 김덕순 역(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1999).
알버트 놀란 저, 기독교 이전의 예수, 오우성 역(서울: 반석문화사, 1993).
E. 케제만 著, 歷史的 예수 硏究, 姜漢杓 譯(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옷도 베츠, 역사적 예수의 진실, 전경연 역(서울: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78).
제임스 M. 로빈슨,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새로운 연구, 소기천 역(파주: 살림출판사, 2008).
______, 예수의 복음: 최초의 복음서 찾기, 소기천 송일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존 도미닉 크로산 지음, 역사적 예수, 김준우 옮김(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______, 예수는 누구인가: 역사적 예수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 한인철 옮김(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1998).
클라우스 S. 크리거, 예수는 실제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김명수 역(광명: 파피엔, 2009).
핸드리커스 보어스 지음, 예수는 누구였는가? : 역사적 예수와 공관 복음서, 박익수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훼르디난드 한 지음, 역사적 예수 연구와 신약성서 신앙, 최재덕 옮김(서울: 한국장로교출판부, 1996).
(필자가 미력하여 여기에 정리하지 못한 회원들의 귀한 연구들이 있다든지 혹은 다른 연구 결과물들을 알고 있다면, 차후에 이메일 kychunso@pcts.ac.kr로 보내주십시오. 보완하겠습니다. 샬롬^^)